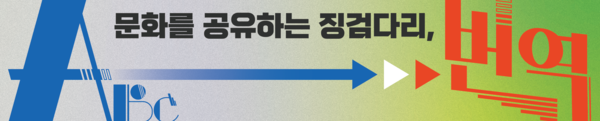
번역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번역(translation)은 라틴어 ‘트란스페로(transfero)’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건너서’, ‘넘어’를 뜻하는 ‘트란스(trans)’와‘나르다’,‘운반하다’를 뜻하는‘페로(fero)’가 합성된 말이다. 즉, 번역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를 운반하는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번역 없이는, 한 나라의 문화는 민족 문학에만 갇힐 수밖에 없다. 번역을 통해 비로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의역과 직역, 자연스러운 글과 뜻을 최대한 전달하는 글
번역은 의역과 직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역은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고, 직역은 번역어에 충실한 번역이다. 즉, 직역은 기존 언어의 구조와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번역이고 의역은 바꾸려는 언어에 자연스럽게 바꾸는 번역인 것이다. 의역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원문에서 지나치게 벗어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번역가가 원문의 나라 문화와 번역할 언어의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역이 오역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직역은 원문에 충실해 저자의 의도를 비교적 덜 훼손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직역과 의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자는 한 작품의 번역을 시작할 때, 의역을 할 것인지, 직역을 할 것인지 작품 내의 번역 원칙을 정해야 한다.
<번역의 탄생> 작가 이희재는 의역과 직역을 결정할 때 미시적 기준과 거시적 기준을 고려한다고 한다. 미시적 기준은 어떤 종류의 글인지, 누가 읽는지를 뜻한다. 글의 종류에 대해 예를 들면, 소설, 여행기, 철학서, 제품 설명서 순으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직역이 걸맞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번역할 때 쓰는 말과 문체가 달라질 것이다. 반면, 거시적 기준은 한 나라 번역 문화의 풍토를 말한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번역이 있는데, 그중 영미 번역계는 자국 독자의 기호를 중시해 깔끔하고 세련된 영문으로 번역한다. 즉, 원어를 영문으로 길들이는 전통이 강하다. 그 예시로, 최인훈의 <광장>의 작품의 이름이 왜 ‘광장’인지를 설명하는 서문을 영역본<광장 (The Square)>에서는 뺐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작가의 ‘감사의 말’과 같은 사소한 내용마저도 번역본에 포함한다. 즉, 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최대한 원본을 살려주려는 직역의 전통이 강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언어의 번역 문화에 따라 직역과 의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한 한국어의 개성 알기
직역은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다는 장점이 있으나, 번역 투가 생기는 등 한국어 글이 외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전통적인 한국어의 개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어는 원래 주어나 목적어로 추상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시로, “도움을 요청했다”보다는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를 선호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가 더 익숙하고 세련되게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번역문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영어는 추상도가 높은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와도 어색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어도 영어의 구조에 많이 가까워져, “그는 사랑을 원한다”와 같이 명사가 목적어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한국어는 동사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이 크고, 영어는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명사가 많은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문을 위해서는 영어 명사와 형용사는 되도록 한국어 동사와 부사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물론 영어의 형용사는 한국어의 관형사로 옮길 때가 가장 많다.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이나 문장,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와 달리, 관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체언의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예를 들면, nasty weather는 ‘끔찍한 날씨’로, ardent love는 ‘애틋한 사랑’으로 옮긴다. 그러나 이때 끝이 ‘-적’으로 끝나는 관형사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명사에 접미사 ‘-적’이 많이 붙는데, 이는 19세기 후반에 서양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일본과 중국에서 만들어내면서 추상 명사의 관형사형은 대부분 끝에 접미사 ‘-적’을 붙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시로 문화적, 과학적, 개념적, 이론적 등을 파생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적’은 한국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적’을 남발하면, 쓸데없이 어렵게 꾸민 좋지 않은 글이 된다. 글의 주인공은 주어와 서술어인데, ‘-적’이 들어가는 관형사를 사용하면 서술어와 주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어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명사를 바로 붙여도 될 때가 있다. 영어 essential elements를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그냥 ‘필수 요소’라고 번역하면 된다. 또한, ‘-적’을 ‘-롭다’와 ‘-답다’나 동사를 써서 바꿀 수 있다. ‘야만적인 행동’을 ‘야만스러운 행동’, ‘지도자적 의견’을 ‘지도자다운 의견’으로, ‘자극적인 행동’를 ‘(사람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의 개성을 파악한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말을 만들어 쓰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있는 말들이 있다. 예시로, 1964년의 <포켓영한사전>에서 hamster는 ‘일종의 큰 쥐’라고 나오며, 괄호 안에 ‘볼주머니가 있고 꼬리가 짧음’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2005년의 <엣센스 영한사전> 10판에는 ‘햄스터’라 나오고 괄호 안에 ‘일종의 큰 쥐’라 되어 있다. hamster가 ‘일종의 큰 쥐’에서 ‘햄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햄스터를 접하게 되며 햄스터가 무엇인지 알고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에 마땅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 외국 단어들이 있다. 사전의 경우 뜻을 설명해두면 되지만,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쓸 수 없기에 대응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예시로, 영어 journeymen은 사전에 ‘(과거 도제 수업을 마치고 남 밑에서 일하던) 장인’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맞게 ‘중간 기술자’ 정도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말을 지을 때, 원어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개념의 핵심을 파악해 드러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각종 시험을 평가하고 교육 방식을 개발하는 영국의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라는 정부 산하의 시험 감독 기관에 대한 번역을 보자. 이를 구글에서 ‘자격 및 교육 과정 평가원’이라 번역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과’나 ‘와’를 넣는 것보다는 명사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렇기에 QCA를 ‘자격교육과정원’이라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qualification과 curriculum의 사전적 단어인 ‘자격’과 ‘교육 과정’을 굳이 넣지 않고, 단어의 핵심인 역할을 쉽게 표현하는 ‘교육수험평가원‘ 정도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다.
번역가는 사전의 틀을 넘어 읽는 사람에게 원문의 뜻을 최대한으로 전달해야 한다. 사전에 다 담기지 못한 뜻은 번역자가 말을 만들어서라도 담아내야 한다. 동사와 부사를 좋아하고, 명사끼리의 결합력이 강한 한국어의 개성을 알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다. 이처럼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어 서로를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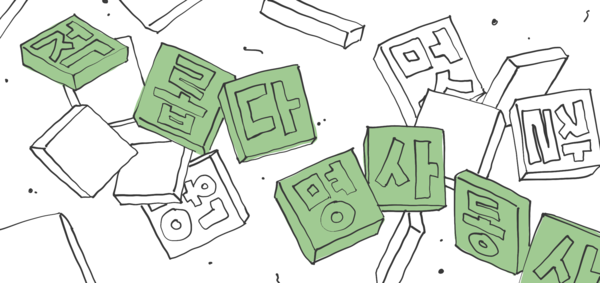
참고문헌 |
<번역의 탄생>, 이희재, 교양인(2009)
<번역가의 길>, 김욱동, 연암서가(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