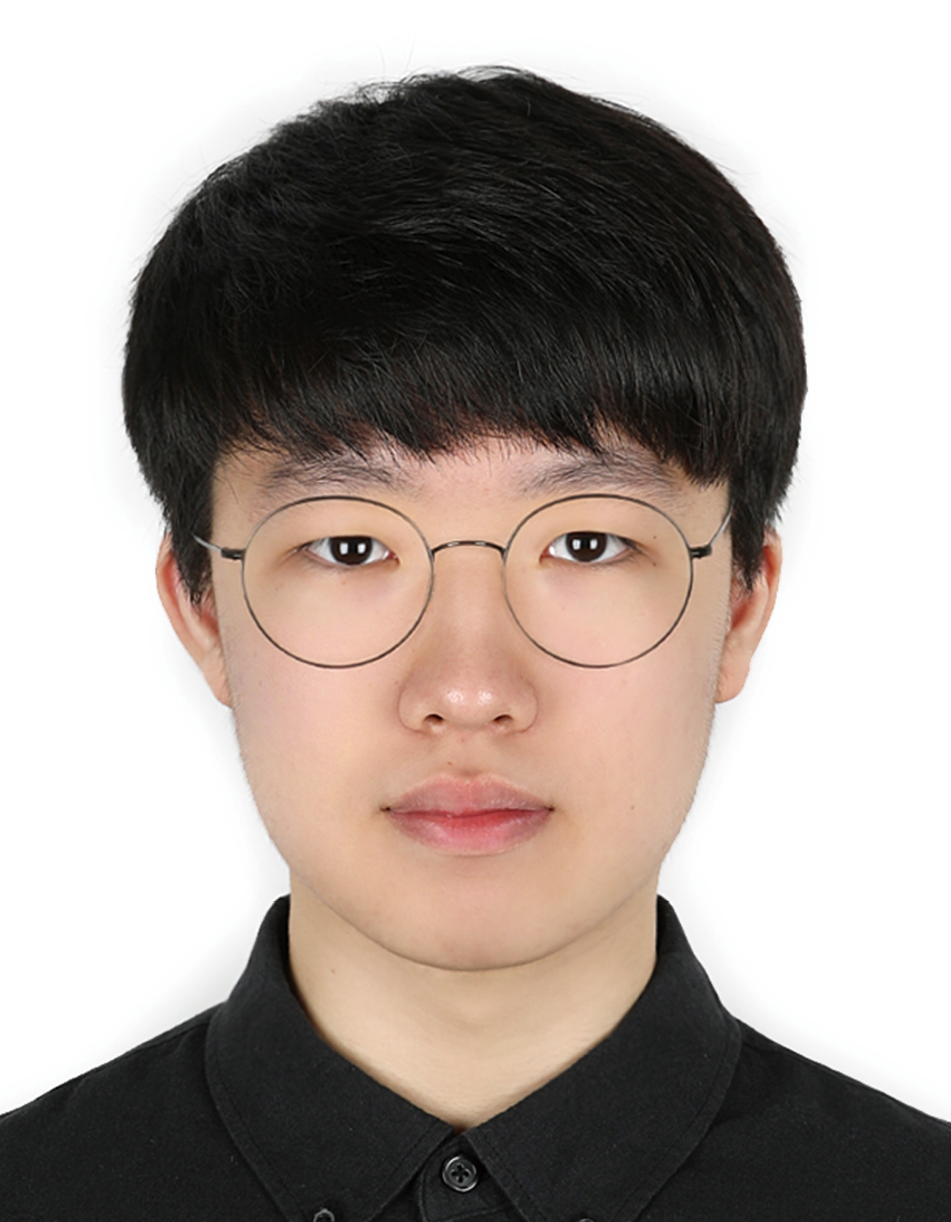
작년은 저에게 꽤나 뜻깊은 한 해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살면서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고향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서 드디어 대학생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떠났던 MT부터, 신문기자가 되어 기사를 쓰게 되었던 일까지. 당장 반 년 전만 해도 책상에 앉아 문제집이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새내기에게는 대학에 와서 한 모든 일들이 특색있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특색 넘치는 경험들 중에서도, 수습기자로 6개월, 학술부장으로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편집장이 되어 있는 지금의 경험은 그간의 어떤 일들과 비교해도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힌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편집장으로 첫 까리용을 쓰고, 처음으로 신문 기사 발행란 편집장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는 지금도 머리로는 편집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괜시리 두근거리는 이 느낌이 어제 기사들을 교정하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내는 첫 신문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 받은 제 자신의 설렘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렘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마주함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학내 구성원들께서 만족하며 읽을 수 있는 신문을 쓸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게 될 신입생들, 또 새로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게 될 졸업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내 구성원분들이 언젠가 비슷한 순간을 지나쳐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문사는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떨림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3년 신문사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신문사 기자분들과 함께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에서 그려나갈 도전의 순간들을 비롯하여 저희 신문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