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글레이저, 데이비드 커틀러 - 「도시의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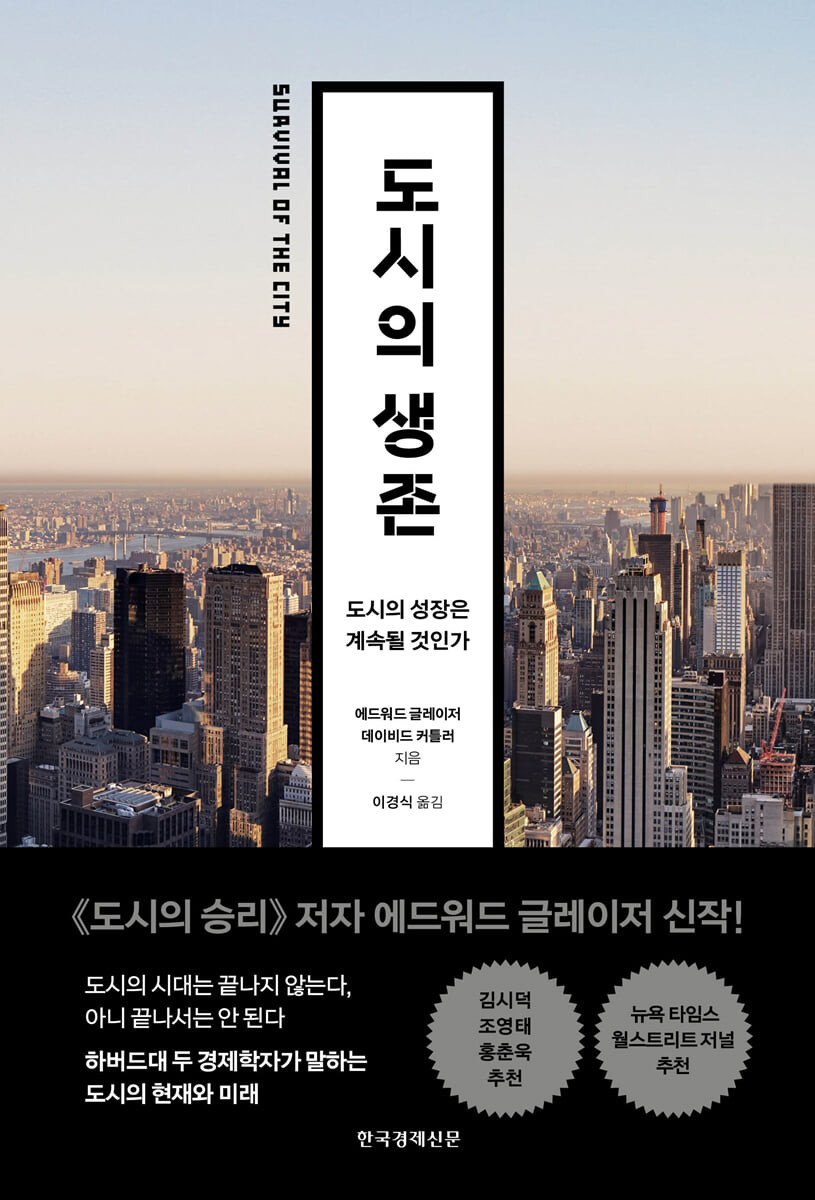
21세기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도시에 산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향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지곤 한다. 특히 도시 중심의 인구 과밀화로 지방과 촌락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형국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본산이 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책이 던지는 화두들은 더 이상 학문의 영역이 아니며 실존적 삶의 영역으로 틈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오늘날의 도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도화된, 그리고 밀집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촌락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도시는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높은 밀도로 인해 전염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세계의 수많은 도시는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았다.
과거의 도시는 행정, 문화, 경제 그리고 교통에 이르는 모든 기반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도 성장은 사회 구성원 간 높은 의존도에 따른 부정적 이면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도시 또한 성숙함에 따라 더 이상 성장은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에 이르러 곪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책 <도시의 생존>은 팬데믹 위기와 같은 외생적 변수에서 출발하여 교육, 사법 등 내생적 요인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미래의 모습을 진단한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모하지 못한 도시는 종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저자의 서늘한 지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이 책은 결코 도시의 역사에 종언을 고하지는 않는다. 도시의 시대가 끝나서는 안된다는 짧은 어구로 출발하여 끊임없이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체제와 대안을 논한다. 지난 2,500년 간의 도시 역사에 대한 분석이 비판의 범주에 있다면, 전망은 희망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10·29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사회가 등한시한 질서의 정립 속에서 수많은 개인들은 스러져갔다. 그 깊이조차 헤아릴 수 없는 연유들로 과밀화된 도시를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치안과 사법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도시의 시스템은 보다 견고해야만 하지 않을까. 도시가 ‘생존’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 되길, 그리하여 그 속에서 부유하는 모든 이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옮기며, 많은 독자들이 본 도서를 탐독하고 또한 함께 고민하길 작게나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