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460명 ‘대전지역 대학생 연합’ 설립한 김선재 동문
그는 자신을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행동으로 옮겨 보는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일까. 기계공학전공 김선재 동문이 걸어온 길은 파란만장하다.
김 동문은 신입생 시절 반대표자협의회 의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용자들’의 ‘용자왕’(회장)과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지역 대학생 연합(이하 대전대련)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교를 찾은 김 동문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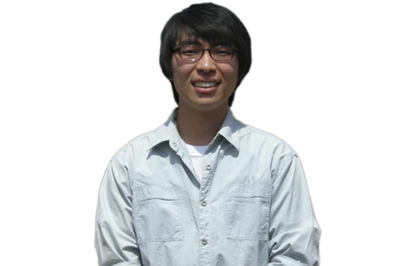
비대위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한 학기 공부했어요. 가을 학기에 졸업한 뒤 대전대련을 만들었어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전대련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해 보고 싶은 건 꼭 하는 성격이에요. 학교에 있으면서 대전지역 대학생 연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권리도 찾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지요. 마침 졸업 후에 시간이 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고, 지난해 말 만들었어요.
조직을 꾸리게 된 과정은
처음부터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요구를 가진 대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 비슷한 처지의 대학생들이니까요. 수도권 학생들만 더 뛰어나서 그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로 한 건 없어요. 모임을 개설하고, 이러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 모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조직은 개인회원제에요. 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려고 모였고, 조직 내 특별한 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하고, 동조하는 회원들이 팀을 꾸리고, 그런 팀이 지금 12개 있어요. 조직에 중점이 없어요. 중앙집권이 아닌 산발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체제이다 보니 모두가 중심이에요.
계획했던 지향점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럼요. 회원들이 자발적이에요. 스스로 뭘 가져와요. 프로젝트 규모가 마구 커져요. 참가하는 회원들이 말하기를 모임이 굉장히 좋대요.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요. 규모는 작아요. 대전 대학생 10만 명 중에 0.5%에요. 그래도 작은 한 걸음을 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되면, 지금 대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요.
대전대련의 활동 방향은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 권리, 행복, 재미’를 네 가지 중요한 화두로 삼았어요. 공동 의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지양하고 싶은 건 상업성과 수직성이에요. 우리는 회칙도 없고, 좀 막장이죠. 회칙과 간부, 보직이 있으면 조직이 딱딱해져요. 자발적 참여가 안 돼요.
총학 비대위 ‘두드림’을 되돌아본다면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비대위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직선 회장단이 아니라 전학대회에서 간선으로 뽑혔어요. 학교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더군요. 학교가 학생회비를 걷었는데, 이를 넘겨주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낸 것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열 걸음을 가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고 생각해요. 퇴임하면서, 총학 소식지를 통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는 호소를 했어요. 그 마음 여전해요.
비대위, 만족하는 점과 아쉬운 점은
공동체 문화 포럼이 아쉬워요. 공동체 문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를 만들어보려 했는데, 이게 억지로 만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어떠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포럼 형식으로 토론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지요. ‘아고라 인 KAIST’도 아쉬워요. 학우 대토론회를 열어 온라인 생중계까지 하려 했는데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어요. 회칙개정, 일일보고와 간담회가 만족스러운 점으로 기억에 남네요. 학생회칙을 개정해 사무재정시행세칙을 도입했고, 과학생회장 직선제도 도입했어요. 동아리별로, 학과별로 연락을 해서 학우들을 직접 찾아갔고요.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견해는
안타까워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2008년부터 다들 예상했잖아요. 그때 (‘용자들’을 비롯한 학우들이) 발표했던 자보를 보면 이미 우리 학교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이를 잘 봉합해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곪아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에 대한 대안도 자료를 근거로 다 제시했고요. 학교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나요.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앞으로의 계획은
항상 그렇듯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재밌게 살 거예요. 저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히 할 일을 한정짓기는 어렵네요.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싶고 관심은 많아요. 큰 방향성은 정하되 너무 한정짓는 것은 싫다는 철없는 생각이에요. 나이가 스물여섯 개인데 말이죠.
용자들 = 2008년 학사개혁에 반대하는 학우들이 모여 한시적으로 활동한 단체로, 대자보와 성명 등을 통해 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손하늘 기자
press@kaist.ac.kr

